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부품업체 수출 실적을 강조했다. 지난해 부품 수출액만 10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1차 300여 협력사가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의 해외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해 '동반성장'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내용만 보면 마치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협력업체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수출실적 증가를 내세운 모양새다. 물론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현대기아차의 동반 성장 전략에 따라 부품 업체도 함께 성장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조합은 현대기아차가 독점 납품을 양보한 덕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사와 독점적 거래를 원하는 다른 완성차회사가 적지 않다고 표현했다. 성장 배경 자체가 현대기아차 배려 덕분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 부품 업체의 해외 적극 진출은 사실 현대기아차 외에 르노삼성, 한국지엠, BMW코리아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둔 르노삼성은 부품 국산화를 비롯해 지난해 르노 글로벌 구매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납품 기회를 알선했고, 한국지엠 또한 글로벌 소형차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만들어지는 동일 차종에 국내 업체들의 부품 납품 기회를 부여했다. BMW코리아도 독일 본사와 협업을 통해 한국산 부품 공급을 주선했다.
사실 자동차에 활용되는 부품처 발굴은 완성차회사의 능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 현대기아차도 해외 부품 업체의 구매 비중이 적지 않다. 컨티넨탈이나 보쉬, 델파이 등 글로벌 대형 부품업체 거래를 통해 프리미엄 차종의 제품력을 높여가는 중이다. 쉽게 말해 완성차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내든 해외든 공급처를 가리지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조합이 현대기아차만 띄우는 것은 한국에 생산 및 판매망을 둔 르노삼성 및 한국지엠 등 해외 업체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씁쓸함이 남는다. 최근 현대기아차의 5,000여 협력사 해외 동반 진출 부각에 따른 발맞추기지만 다소 과장된 느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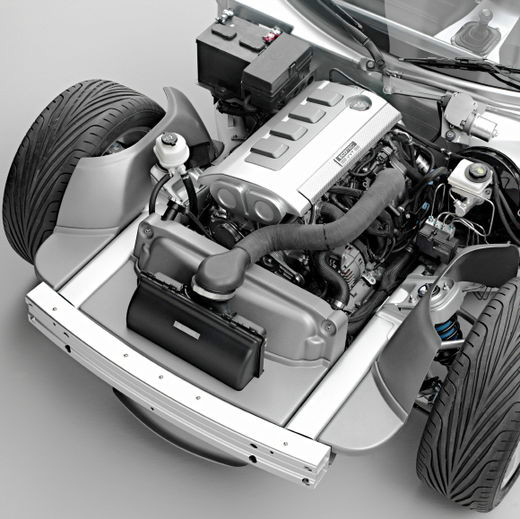
사실 부품업체의 자체 경쟁력 확보는 큰 흐름이다. 완성차회사와 별개로 자생 기반 구축은 필연 과제다. 심지어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장기적 생존을 위해 해외 납품 비중을 늘려가는 중이다. 특히 모비스가 롤 모델로 삼는 곳은 일본의 부품회사 덴소다. 토요타 부품사업부로 시작한 덴소의 토요타그룹 납품 비중은 40%에 불과하다. 모비스 또한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인 셈이다.
최근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한국지엠에도 납품하는 K사를 찾았다. K사를 포함해 많은 부품사를 만나면서 들었던 공통된 얘기는 납품 총액이 아니라 '이익'이다. 분명 한국차 성장에 발맞춰 납품 물량은 늘었지만 이익은 여전히 제 자리를 걷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벌어들인 이익으로 보다 나은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싶어도 여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룬 부품 업체의 성장에는 그 같은 절박함도 충분히 담겨 있었을 게다. 그러니 부품업의 성장은 모두의 덕으로 돌려야 한다. 특정 회사의 비중이 크기는 했지만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